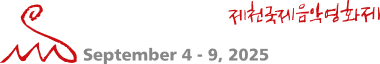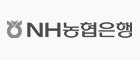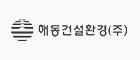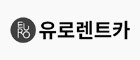페이지 정보
교차하는 현들, 교감하는 별들
|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5 조회1,187 |
|---|
본문
교차하는 현들, 교감하는 별들
<1247> 송우진 감독

▲ 송우진 감독
주보라는 열두 개의 현을 가진 산조 가야금을, 이기화는 마흔일곱 개의 줄로 된 하프를 연주한다. 각자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선을 세어, 두 사람은 ‘일이사칠’이라는 팀명을 지었다. 주보라와 이기화는 그 안에서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배려하며 공존한다. 다큐멘터리 <1247>은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며 첫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의 석 달을 자분자분 따라간다. 두 악기, 두 사람, 두 세계의 창조적 충돌을 지켜본 이는 지난해 <삼비스타>로 제천을 찾았던 송우진 감독. 1년 만에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 한국경쟁’ 섹션에 <1247>을 들고 온 송우진 감독에게 가야금과 하프의 우정을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지난해 브라질의 퍼커셔니스트 발치뉴 아나스타시우를 찍은 다큐멘터리 <삼비스타>에 이어 올해도 <1247>로 제천을 찾았다. 음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한국무용을 하셨다. 어머니의 활동명은 '김세일라'였다. 살풀이의 대가 김진걸 선생님의 제자셨는데,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무용도 하셨지만 스토리텔링이 있는 창작 무용극의 선구자셨다. 그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 전공을 했다. 어머니가 예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웃음) 그래도 어려서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해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보내다시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연극에 빠져 지내고 해적판 음반을 사 모으는 등 늘 예술적 배경 아래 있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자연스럽게 뮤지션들을 카메라로 찍게 되었나.
단편 극영화 작업을 해왔는데, 활동해오면서 이상하게 음악하는 분들의 의뢰가 많았다. 클래식 공연 연출을 많이 했고, 창작 오페라 연출도 했다. 그러다 한 후배가 한국에 14년간 있던 발치뉴 아나스타시우가 한국을 떠나는데, 그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제안했고, <삼비스타>를 찍게 된 거다. <1247>의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 씨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됐다. 몇 번 초대받아서 공연에 갔는데, 가야금과 다양한 악기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현대적인 음악을 하는 게 신선했다. 한번은 주보라 씨가 하프와 컬래버레이션을 한다기에 어떤 연주자와 하는지 물었는데, <삼비스타> 촬영 중 알게 된, 내가 아는 유일한 하피스트인 이기화씨와 한다는 거다. <1247>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화 <1247>의 시작은 화가의 문장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고흐가 동생 태오에게 언제쯤 빛나는 별을 그릴 수 있을지 묻는 편지의 일부를 인용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 후배 중 한 명이 반 고흐를 다룬 뮤지컬을 제작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뮤지컬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 후 고흐에 관한 책을 읽다 그 문장을 발견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별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빛나고 있는데, 고흐조차도 살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 않나. 영화 속 아티스트들도 엄청난 별인데, 본인들도 타인들도 아직 그 빛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그 문장을 넣었다.
영화를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일이사칠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
동서양 음악의 만남, 현과 현의 만남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 그런데 보라 씨는 활동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기화 씨는 굉장히 내향적이다. <삼비스타> 촬영 중 기화 씨를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1247> 촬영이 가능할까 반신반의했는데 보라 씨가 말하길, “(기화) 언니가 너무 오케이 하신다”는 거다. 그 후 미팅을 하고 올해 2월부터 석 달간 촬영했다.
일이사칠의 두 멤버가 합을 맞춰가는 동안 긴장감도 엷게 깔리지만, 서로의 악기를 이해하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두 사람이 인터뷰할 때도 말하지만, 서로의 음악을 동경은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식이 강했다. 서로 다른 과라고 생각한 거다. 그런 짤막한 부딪힘이 있었음에도 두 분이 서로 맞춰가려는 배려심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기화 씨는 하프가 솔로로도 빛나지만 다른 악기를 받쳐줄 때 더 빛난다고 생각더라. 하프가 모양 자체로도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나서는 걸 스스로 못 견디는 거다. 그에 반해 보라 씨의 가야금은 자신 있게 치고 나가는 매력이 있다. 그런 태도로 합을 맞춰가니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음에도 점점 잘 맞아 들어갔고, 작은 트러블조차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촬영에 임한 것 같다.
감독도 같은 창작자로서 일이사칠 멤버들에게 영감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신비함을 느낀 순간이 있다. 가야금 소리과 하프 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일이사칠의 연주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 소리가 가야금이야? 하프야?’ 되묻게 되는 순간이 온다. 객석을 인터뷰해보니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더라. 기화 씨와 보라 씨가 마음이 맞으면서 악기라는 매체로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니 자연히 세상 밖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도 교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즉흥연주에 대한 만족감도 점점 높아지는 걸 보며 그런 신비함을 느꼈다. 관객들도 영화로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정애리 배우의 내레이션도 일이사칠의 음악과 잘 어울렸다.
정애리 선생님이 리더였던, 기독교 베이스의 문화예술인 모임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못 모였는데, 그전에는 8년간 거의 매주 모였다. 이제는 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정애리 선생님이 고문 식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데, 정애리 선생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에 선생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이 관객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아 내레이션을 해주셨다.
단편영화 제작 경험과 창작 오페라 연출 경력도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음악 다큐멘터리 3탄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이 될지 더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편은 더 하고 싶다. 재즈 피아노와 무용의 컬래버레이션을 다큐멘터리로 찍어보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1247>이 제천에서 상영하는 15일이 어머니의 기일이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영화를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한다.
글 남선우 사진 최성열